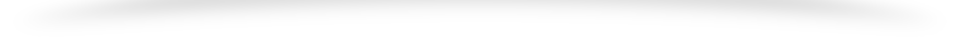“인공생명”
1. 글머리: 생명과 기계의 경계, 몸-마음 문제. 2020. 1. 21.
2. 인공생명과 생명의 철학. 2020. 1. 28.
3. 야콥 폰 윅스퀼의 둘레세계. 2020. 2. 4.
4. 인지과학의 기연적 접근. 2020. 2.11.
5. 생명을 물리학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2020. 2. 18.
6. 온생명과 인간의 관계 & 결론 2020. 2. 25.
글: 김재영 (녹색아카데미)
생명과 기계의 경계는 어디인가?
2017년 12월 딥마인드는 알파제로(AlphaZero)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발표했다. 딥마인드는 2015년 10월에 신경망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의 일종인 딥 러닝를 발전시킨 바둑 소프트웨어 알파고(AlphaGo)를 발표한 바 있는데, 특히 2016년 3월 한국의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과의 시합을 통해 알파고가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알파고는 이름에 포함된 ‘고碁’의 의미대로 실질적으로 세련된 바둑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았으며, 인간의 바둑 기보를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를 극복한 것으로 널리 홍보된 알파고 제로(AlphaGo Zero)나 알파제로도 실상 인간의 바둑 기보만을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하지 않는다거나 바둑 외에 체스나 일본장기까지 포함할 뿐, 역시 또 다른 정교한 소프트웨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Silver et al. 2017a; 2017b).

구글 딥마인드의 공동창업자인 데미스 하사비스는 특정 과제만을 해결할 수 있는 고전적인 인공지능(A.I.)의 고유한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상황들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일반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을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성찰에서 기존의 인공생명(Artificial Life, A-Life)과 폰윅스퀼의 둘레세계(Umwelt) 개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야콥 폰윅스퀼은 둘레세계의 개념을 통해 생명체와 환경 사이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이를 통해 생명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었다. 1980년대에 크리스토퍼 랭턴이 시뮬레이션과 합성이라는 맥락에서 인공생명(A-Life)의 연구를 제안한 이래 부드러운 인공생명(soft A-Life)뿐 아니라 단단한 인공생명(hard A-Life) 및 젖은 인공생명(wet A-Life)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하게 모색되어 왔다.
영국의 인류학자 베이트슨(Gregory Bateson)은 <마음의 생태학>에서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문제를 던진다(Bateson 1972a). 시각장애인의 지팡이는 그 사람의 일부인가, 아닌가? 나에게 안경은 내 몸의 일부인가, 아닌가? 시각장애인은 지팡이를 통해 외부세계로부터의 정보를 얻으며, 이것은 그가 낯선 길을 걸어갈 때 매우 중요한 인식수단이다. 심한 근시인 사람에게 안경은 외부세계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도구임에 틀림없다.

베이트슨의 질문을 단순히 이해한다면, 쉽사리 지팡이나 안경을 인간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쉽다. 다시 말해 인간은 그 몸으로 정의되며, 이를 넘어서는 도구들은 몸의 외부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의 안구는 나의 일부인가, 의안이나 의족이나 의치는 내 몸의 일부인가, 인공신장은 나의 일부인가 등과 같은 의공학적 맥락의 질문이 일어난다. 최근 논자들이 이것을 ‘프로스테시스’(prosthesis)라는 개념으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프로스테시스의 문제’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 글에서 논구하는 문제는 생명 특히 인간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며, 생명과 기계(도구)의 경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과 직접 연결된다. 이것은 최근 ‘인간론’(humanology) 또는 ‘포스트휴먼 연구’(posthuman studies)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인간론’은 대략 말해서 고등기술사회에서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현상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탐구하는 것으로서 특히 생명과 이성의 대안적 형태에 주목하는 학문분야를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특히 기계가 만들어내는 인공적 환경에서 인간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다소 맹목적으로까지 보이는 기술옹호론(technophilia)과 일종의 기술혐오론(technophobia)으로 갈리는 경향을 보인다. 어느 쪽에 편을 들든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관한 논제는 인간 자체의 정의에 대한 이해에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간의 테두리를 정하는 것은 곧 몸의 경계를 구획하는 것에 대응한다. 이 대목이 바로 인터페이스(interface, 界面)가 심각한 인문학적 논제로 등장하는 곳이다. 인터페이스는 원래 페이스(face, 面)와 페이스가 만나는 곳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 ‘페이스’가 무엇인가에 따라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
계면활성제에서의 인터페이스는 비누거품이 섬유와 만나 섬유에 있는 때를 거두어 가는 장이며, 컴퓨터를 조작하는 프로그래머에게 인터페이스는 복잡한 기계어를 기억하지 않고도 미리 약속된 명령어들과 아이콘들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접경이다. 여러 가지 색으로 선명하게 그려진 세계지도를 보자. 국경을 넘어갈 때 풍경이든 새들의 움직임이든 사람들의 주거환경이든 어떤 것도 새로운 색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경 또는 국가 사이의 인터페이스가 인위적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낸다.
그렇다면 인간의 테두리를 정하는 문제, 즉 생명과 기계의 경계를 구획하는 프로스테시스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나는 이 문제를 생명과 물질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들을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인공생명(A-Life)의 논의가 중요해진다 (Riskin 2007; Emmeche 1991; Mindel 2002). 인공생명은 생명을 ‘인실리코’(in silico)로 구현하려는 야심적인 프로젝트이다. 인공생명은 생명, 나아가 인간의 정의에 어떤 새로운 함의를 던지는가?
생명 속의 마음, 몸-마음 문제
이 글의 또 다른 문제의식은 온생명론이 인간에 대해 무엇을 새롭게 말해주고 있는지 면밀하게 밝히려는 것이다 (장회익 2014a; 2014b). 온생명론은 “생명에 관한 본질적 혹은 근원적 이해”를 추구한다. 이것은 “생명이라 불릴 현상이 생명이 아니라고 불릴 현상에 비해 어떠한 특징적 성격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과학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을 구분해낼 현실적 판단을 수행할 단계에 도달하는 것”(장회익 2001)을 목표로 한다.
나는 바로 이러한 접근들이 만나는 길목에 프로스테시스 또는 포스트휴먼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있다고 본다. 몸과 기계의 경계를 가늠하는 문제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에 대한 논의인 동시에, 생명과 물질의 경계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요컨대 이 글은 항상성이 있는 동역학적 계에 대한 사이버네틱스의 접근과 인실리코의 인공생명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를 결국 근원적 생명론으로서의 온생명론과 연결시킴으로써 인간 개념의 정의 문제를 살피고자 하는 시론이다.
온생명론의 주된 관심은 생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곧 물질과 생명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있지만, 온생명론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이 이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장회익 2014a; 2014b). <물질, 생명, 인간>(장회익 2009)은 물질과 생명과 인간을 오롯이 한 그릇 안에 담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이며, 온생명론은 이러한 더 포괄적인 체계 안의 각론으로 보아야 한다. 이 논문의 두 번째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시작한다.
“어느 의미에서 온생명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의식을 지닌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 안에서 의식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는 틀림없이 온생명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온생명 안에서 분명히 의식을 가진 존재는 무엇이며, 그 존재의 의식은 어디에까지 이르는가? 이러한 존재는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이다.”
(장회익 2009: 171-2)
그런데 이러한 서술에는 약간의 개념적 불분명함이 있다. 의식을 지니는 존재는 온생명인데, 인간은 개체생명 중 하나로서 온생명의 부분이다. 온생명이 의식을 지닌다는 말과 온생명의 일부인 인간이 의식을 지닌다는 말은 똑같은 주장이 아니다. 이는 마치 인간이 의식을 지닌다고 말하는 것과 인체의 일부인 뇌가 의식을 지닌다고 말하는 것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이다. 유비에 의하여 인간이 온생명의 중추신경계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온생명 안에서 의식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주장을 따로 정당화가 필요한 언명이다.
더 나아가 위의 인용문이 온생명 안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의식을 가질 수 있음을 함축한다면, 우리는 다시 의식을 가지는 존재가 인간뿐인지 물을 수 있다. 과연 인간만이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가령 동물은 의식을 가질 수 없을까? 중추신경계의 유무가 의식의 유무와 관련될까? 동물의 의식은 인간의 의식과 같은 것일까? 원생생물이나 무생물은 의식을 가질 수 없는 것일까? 온생명이 의식을 지닌 존재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실제 위의 인용문 뒤의 서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간의 출현과 더불어 최근에 이르러서야 온생명이 비로소 자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온생명의 자의식이란 개념이 실상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이 논문의 소박한 문제의식이다. 물질과 생명과 인간(마음) 사이의 관계를 명료하게 해명하는 일은 온생명에 대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편 몸과 기계의 관계를 다루고자 할 때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쟁점은 생명 속의 마음이다. 학습과 기억의 세포 및 분자 메커니즘의 연구로 잘 알려진 영국의 생물학자 스티븐 로즈는 1990년대가 ‘뇌의 10년’이었던 것처럼 2000년대가 ‘마음의 10년’이 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신경과학이 해부학, 생리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행동과학뿐 아니라 생물학, 심리학, 철학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뇌과학과 신경과학의 진면목을 철학과 법률과 실제 연구의 다각도에서 제시하고 있다(Rees & Rose 2004/2010). 그러나 그가 진단하는 신경과학의 양상은 그리 밝은 모습이 아니다.
신경과학자들이 새로운 기술의 대단한 능력에 심취하여 마지막 남은 미지의 땅, 즉 의식 자체의 본성에 대해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다. 물론 이것은 그런 의식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 합의가 있다고 가정할 때의 일이다. 그런데 그런 합의는 없다. 신경과학들의 급속한 확장으로 분자보다 작은 단계로부터 뇌 전체의 단계까지 거의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양의 데이터와 사실과 실험적 발견을 얻었다. 문제는 이 덩어리를 어떻게 정합적인 뇌 이론 속에 끼워 맞추는가 하는 것이다. 뇌는 역설로 가득 차 있다.(Rees & Rose 2004/2010: 12-14)
뇌과학과 신경과학의 괄목할만한 발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식의 본성에 대한 해명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환원주의라고 대별할 수 있는 주장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 쟁점 중 하나라는 로즈의 진단에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특히 신경과학의 새로운 성과들을 통해 전통적으로 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몸-마음 문제(Mind-Body Problem)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얻으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렵다.

철학적 사유의 전통 대신 신경과학을 출발점으로 삼아 의식을 이해하려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문제를 다른 틀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담고 있다. 기존의 연구 맥락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비판한다기보다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짚어보려는 것이다.
거칠게 말하면, 최근의 신경과학의 성과를 염두에 두고 영미권 심리철학이 미묘한 거리를 두는 현상학적 사유의 전통에 주목해 보자는 것이며, 몸-마음 문제를 몸-신체-마음 문제(Mind-Body-Body Problem)로 바꾸어 생각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른바 ‘비인간 전환 nonhuman turn’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는 사변적 실재론 [객체지향철학, 신생기론, 범정신주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 신물질주의 (페미니즘 및 마르크스주의), 장치의 이론, 감응[정동] 이론, 동물 연구, 뉴미디어 이론, 새로운 뇌 과학 (신경과학, 인지과학, 인공지능), 사이버네틱스와 시스템 이론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Grusin 2015).
다음 절은 인공생명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며, 이를 포괄적인 생명철학의 맥락에서 검토한 뒤, 본격적으로 온생명론이 프로스테시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본다. 그 다음 현상학적 사유로서 인지과학의 기연적 접근과 윅스퀼의 둘레세계를 간단하게 살핀다.
현상학적 사유라 함은 세계가 원래부터 그렇게 존재하다가 주체에 주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세계를 단순히 주체가 그려내는 관념적 상상의 산물로 보는 것도 아니라, 세계와 주체의 만남에 주목하는 철학적 논의를 가리킨다. 이러한 현상학적 사유들이 온생명론과 어떻게 만나는지 살펴보고, 이로부터 다시 생명이라는 문제를 되짚어 봄으로써 글을 맺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재영 (2017). “사이버네틱스에서 바라본 생명: 비인간전환의 관점”. <정보혁명 – 정보혁명 시대, 문화와 생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다>. 한울아카데미.
- 장회익 (2001). “유전자와 온생명: 미시적·개체중심적 생명 연구의 한계”, 「과학과 철학」, 제12집 53-76.
- 장회익 (2009). <물질, 생명, 인간: 그 통합적 이해의 가능성>, 돌베개.
- 장회익 (2014a).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까>, 한울아카데미.
- Bateson, G. (1972a). Steps to an ecology of mind, Ballantine Books; 박대식 옮김 (1992). <마음의 생태학>, 책세상.
- Grusin, R. ed. (2015). The Nonhuman Turn. Univ of Minnesota Press.
- Riskin, J. ed. (2007). Genesis Redux: Essays in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Artificial Lif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ees, D. & Rose, S. (2004). The New Brain Sciences: Perils and Prospec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재영, 박재홍 옮김 (2010). <새로운 뇌과학, 위험성과 전망>, 한울.
- Silver, D. et al. (2017a).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out human knowledge”. Nature. 550 (7676): 354–359.
- Silver, D. et al. (2017b). “Mastering chess and shogi by self-play with a general reinforcement learning algorithm” arXiv:1712.01815 [cs.AI].
(2)편 인공생명과 생명의 철학으로 이어집니다.
과학칼럼 연재 “인공생명” 시리즈는 김재영(2017)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과학칼럼은 매주 화요일에 업로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