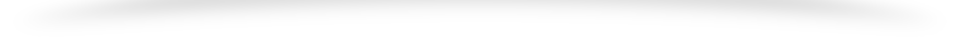슈뢰딩거의 1935년 논문은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인 얽힘과 측정을 다룬다. 특히 처음으로 ‘양자 얽힘’의 개념을 정립하면서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 논문에 대해 세 번에 걸쳐 소개한다.
“슈뢰딩거의 1935년 논문”
(1) 슈뢰딩거의 묘비명
(2) 얽힘
(3) 측정
2019년 11월 12일
김재영 (녹색아카데미)
슈뢰딩거는 여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측정의 이론을 전개한다. 측정과정을 얽힘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얽힌 상태의 두 부분계 중 하나를 측정되는 대상으로 하고 다른 하나를 측정장치로 하면 된다.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 측정장치를 자동장치로 만들고 눈금을 읽는 것은 최대한 뒤로 미룬다. 이렇게 자동으로 데이터를 얻는다면 전체 계에 대한 최대 기대값 목록을 얻게 된다.
이 측정결과는 조건부 명제로 되어 있다. 장치에 있는 펜이 1번 줄에 표식을 남긴다면 대상은 이러저러한 상태이고, 2번 줄에 표식을 남긴다면 또 이러저러한 상태에 있다는 식이다. 측정되는 대상의 함수에도 도약이 없으며 그렇다고 파동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자연법칙에 따라 변한 것도 아니다.
대상의 기대값 목록은 부분들의 기대값 목록들의 조건부 논리합이다. 즉 여러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이다. 만일 사람이 측정결과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손실되는 지식은 없다.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살아 있는 주체이다.
“측정대상과 측정 장치의 결합에서 대상이 분리되는 것은 오직 살아 있는 주체가 측정 결과를 실제로 인지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얽힌 상태의 선택지 중 하나를 결정하는 들여다봄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런 불연속도 생기지 않는다. 슈뢰딩거는 이를 정신 작용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대상과 측정 장치 사이의 물리적인 상호작용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고, 그 뒤에는 대상이 아무런 물리적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관찰자와 무관하게 편미분방정식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의 함수가 이제 와서 일종의 정신 작용을 통해 불연속적으로 변화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상의 함수는 이제 사라져 버리고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없는 것이 변화할 수는 없다. 대상의 함수는 인식행위(Wahrnehmungsakt)를 통해 다시 태어나고 다시 구성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꼬여[얽혀] 있는 지식으로부터 분리된다. 그 인식행위는 사실상 측정대상에 대한 물리적 효과가 아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함수의 형태로부터 다시 나타난 새로운 형태로 가는 길은 연속적이지 않다. 그 길은 실상 소멸을 통해 나아간다. 이 두 형태를 대조시키면 상황은 도약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
– 슈뢰딩거 (강조는 인용자)

슈뢰딩거가 보기에,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과 측정 장치 사이의 얽힘이지만, 이를 통해 여러 가능한 선택지들 중 하나로 가게 되는 것은 물리적 효과가 아니다. 새로운 상태 함수는 이전의 상태 함수로부터 연속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신 작용을 통해 대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슈뢰딩거가 측정 과정이 단지 물리적 상호작용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일찍이 아인슈타인은 구성적 이론(constructive theory)과 원리적 이론(principle theory)을 구별하면서, 원리적 이론에서는 임의적인 요소들이 최대한 배제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가령 상대성이론에서조차 시계나 막대와 같은 요소들을 통해서만 측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았다. 양자역학이 원리적 이론이라면 측정과정도 양자역학으로 서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원리적 이론의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다.
슈뢰딩거가 세 번에 걸쳐 나누어 발표한 이 논문, “양자역학의 현재 상황”에서 굳이 두 절을 할애하여 ‘측정의 이론’(Theorie des Messens)을 상세하게 논의한 것은 측정과정을 양자역학의 형식이론, 즉 자신의 이름이 붙은 상태변화의 방정식만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측정과정도 두 부분계 사이의 얽힘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결국 측정 장치로부터 대상계의 상태를 읽어내는 것은 살아 있는 주체임을 강조함으로써, 측정의 이론을 형식적 양자역학으로 환원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셈이 되었다.
양자 얽힘은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고 이어져 있다는 고대 인도의 우파니샤드의 사상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종종 이야기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주장은 물리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궁극의 실재로서의 브라흐만과 각 개인의 영혼과 정신으로서의 아트만이 하나라는 베단타 특유의 사상을 깊이 공부하고 성찰했던 슈뢰딩거는 적어도 자신의 묘비명에서는 그런 얽힘과 이어짐을 역설하고 있다.
양자역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측정의 문제를 형식적 양자역학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슈뢰딩거의 주장도 얽힘에 대한 그의 고유한 이해와 연결될 것이다. 슈뢰딩거의 1935년 논문을 1942년에 슈뢰딩거 자신이 쓴 묘비명과 연관시키는 것이 아주 무리한 일은 아닐 것이다.
Denn das, was ist, ist nicht, weil wir es fühlen,
E. S. 1942
Und ist nicht nicht, weil wir es nicht mehr fühlen.
Weil es besteht, sind wir und sind so dauernd.
So ist denn alles Sein ein einzig Sein.
Und dass es weiter ist, wenn einer stirbt,
sagt dir, dass er nicht aufgehört zu sein.
“그러니까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속되므로, 우리는 있으며 그렇게 이어진다.
따라서 그렇게 모든 존재는 하나뿐인 존재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죽는다 해도 그것이(그가) 계속 존재하며
그것이(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림 2] 슈뢰딩거의 묘비명. 오스트리아 티롤 (사진 : 김재영) 
[그림 3] 슈뢰딩거의 묘비. 오스트리아 티롤 (사진 : wiki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