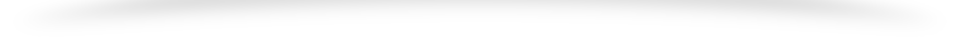녹색아카데미 웹진의 기사를 녹색문명공부모임(매달 두 번째 토요일과 자연철학세미나(격주, 목요일)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 뉴스와 칼럼은 녹색문명공부모임에서 이야기할 주제나 책을, 앞서 소개하거나 더 심도있게 다루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모임에서 시작한 책 <탄소 사회의 종말>이 첫 주제이고 오늘은 그 두 번째 글입니다.
이 책에는 엄청난 참고 자료와 인용 문헌이 있는데요. 그 중에 기후과학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탈인간화”되었는지 잘 정리된 논문이 있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긴 논문이라 다 옮기지는 못했고,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골라서 요약했습니다. 혹시 중요한 내용이 빠졌을 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2021년 5월 녹색문명공부모임 자료 <탄소 사회의 종말> 1~8장.
<탄소 사회의 종말> 시리즈 모두 보기 링크
“The climate change dilemma: big science, the globalizing of climate and the loss of the human scale”Regional Environmental Change volume 19, pages 1549–1560 (2019)Matthias Heymann. Centre for Science Studies, Aarhus University(오르후스 대학교), Denmark.
개요
기후 정책 실패 뒤에는 기후 개념이 “탈인간화”(dehumanization)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게 향상 되었지만, 거시적인 시공간 규모로 환원주의적인 수량화와 모델링에 연구가 집중되었고, 기후를 보는 전지구적인 관점, 개념, 지식이 지역적인 경험과 지식, 정치적 행동으로 전환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구 경향은 거대하고 전지구적인 규모의 지식을 만들어왔고 “위로부터의 지식”(knowledge from above)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원래 훔볼트적인 개념의 기후학은 상세한 지역 정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인간사를 떠받칠 수 있는, 인간적인 규모가 초기 기후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지역 규모의 지식을 우선하는 기후학은 “아래로부터의 지식”(knowledge from below)라고 할 수 있으며, 20세기 초반까지는 이러한 기후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20세기 동안 연구 방식과 과학적 개념이 전지구화하면서 기후를 이해하는 방식이 어떻게 “탈인간화”되었는지 살펴봅니다. 과학과 정치의 이해관계가 전지구화 의제를 밀어 붙였고, 기후 지식을 인간 규모로부터 멀리 떼어 놓았습니다. 이 연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식의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토대와, 지적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아래부터의 지식을 재인식하고, 아래와 위로부터의 두 가지 유형의 지식의 연결을 다시 만들어내려면 말입니다.
기후과학은 원래 이렇게 전지구적이지 않았다
이 논문은 나오미 클라인의 다큐멘터리 영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기후변화 영화들이 추정적이고 늘 북극곰이 나온다며 비판을 하지만, 클라인의 영화도 그리 성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기후변화 문제가 매우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리기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농업, 어업, 운송과 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 지식이 기후학이 다루는 바로 그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기후학은 매우 강력한 아래로부터의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데이터와 지역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모으고 인간사를 떠받치는 일이 중심이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중반까지는 이러한 학문적 정체성이 있었지만, 냉전시대를 거치며 기술과학적인 모델링 경쟁이 강화되면서 기후학의 지역적인 성격이 점점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지역적인 다양성과 세부적인 사실들을 무시하고 위로부터의 관점을 취함으로써 기후과학과 기후에 대한 지식을 엄청나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은 날씨와 기후의 무질서한 다양성과 복잡성을 무시할 수 있게 했고, 물리적인 이론을 가능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학적으로 기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인간이 날씨와 기후를 제어할 수 있다고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기후과학은 지식에서의 우월성으로, 또 인간 본위의 아래로부터의 “고전적인” 기후학을 효과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전지구화하는 환원주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후과학이 지구화되기 시작한 시점을 보려면 적어도 19세기까지 되돌아가야 합니다. 기후과학이 전지구화되는 과정에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이 있으며, 지식의 정치학이 변화한 것도 있습니다. 양화(quantification)하고 수학적인 이론을 우선시 하는 과학 이데올로기들, 제국주의 시대나 20세기 초 나치와 국가사회주의 정부 하에서 환경을 제어할 수 있다는 약속들, 냉전 시기 지정학적 이권들 등 이 모든 것들이 기후과학을 전지구화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고전 기후학”이 점점 전지구화되어 갔다
알렉산더 폰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는 여러모로 기후학이라는 과학 분과가 생겨나게 이끌었으며, 후대 기후학자들은 이를 두고 “고전 기후학”(Classical climatology)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훔볼트에 따르면 기후란 “가장 보편적인 의미로 인간의 기관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는 대기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뜻하며, 온도, 강수량, 습도, 기압과 바람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후 개념은 특정한 위치, 지구 표면과 연결되며, 인간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이것은 전체론적인 개념이며, 인간의 감각에 영향을 주는 모든 대기 현상을 포함하며, 기후에 대한 인간의 영향과 인간에 대한 기후의 영향에 대한 조사도 모두 포함합니다. 도시기후학과 같은 기후학의 하위 분과는 기후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의료 기후학과 생물기후학은 인간에 대한 기후의 영향에 초점을 둡니다.
고전 기후학은 아래로부터 접근하는 연구 방식을 취해왔고 지역의 다양성과 세부적인 사항들을 중요하게 평가해왔지만, 기후학 자체에 이미 전지구적인 관점의 씨앗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훔볼트도 이미 기후를 거시적인 관점으로 구성해내려고 시도했습니다. 훔볼트 이후 오스트리아 빈의 기상학과 지구자기학 중앙연구소의 소장이었던 율리우스 한(Julius Hann)과 함부르크의 독일 해양 관측소의 소장이었던 러시아계 독일인 블라디미르 쾨펜(Wladimir Köppen)이 훔볼트의 기후 개념을 가져와 엄격한 실험적 과학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1883년에 출판된 한의 <Handbook of Climatology>는 “현대 기후학”의 초석을 놓았습니다(Coen 2010, p. 844). 이 책에서 고전 기후학과 연구 방법의 주요 특성들이 정의되었고 이후 “일반 기후학”(averaging climatology)이라 불리게 될 국제 표준 참고문헌이 되었으며, 이어지는 개정판에 이 분야의 발전 사항들이 포함되면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기후학이 전지구화된 두 번째 이유는, 영국이나 프랑스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조사할 때 전지구적인 규모의 기후학을 정립하고 촉진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에서 일궈진 제국 과학은 기후학의 관점을 전지구적으로 강화하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열대 지역의 기후와 가뭄, 탈수, 경작 실패 그리고 기아 등에 대한 두려움에 도전하면서 의료 분야와 기상 과학의 발전이 밀어붙여졌습니다.
또한 유럽으로부터 먼 곳의 데이타와 경험을 자국과 비교할 기회를 가지면서 기후 패턴과 식생의 변이를 전지구적인 규모로 확장해서 사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91년 발생했던 매우 강력한 엘니뇨 현상을 알게 된 것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일하던 동인도회사 소속의 박물학자들이 서신을 교환하면서 가능했습니다(Grove and Adamson 2018). 20세기 중반까지 식민지에서의 관측 네트워크는 기후 데이타의 중요한 원천으로 남아있었으며 자국에서 먼 지역까지 기후 지식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Mahony 2016; Lehmann 2017).
셋째, 전통 기후학은 지구 표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기상학자들과 기후학자들은 관측 대상을 더 높은 대기 층으로 확대(기상학)하고 전지구적인 대기 순환을 조사(기후학)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큰 규모의 대기 순환에 대한 물리 이론이 18세기 이후 논의 되었지만, 당시에는 비교해볼 수 있는 관측 자료가 너무 적었습니다. 산에 위치한 관측소에서, 19세기 후반 이래로는 풍선이나 연을 이용한 관측을 하면서 세기말 직후에 하위 분과인 “고층 기상학”(Wladimir Köppen)이 생겼습니다.
20세기 초반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 그리고 이후에 항공 운송을 위한 기후 정보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층 기상 관측이 더욱 확대되어 갔습니다. 1930년대 이후 라디오존데(radiosondes. 고층 기상 관측기)가 도입되면서 고층 대기권에 대한 데이타와 지식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 데이타를 바탕으로 1935년 이후 독일 기상학자(Richard Scherhag)는 상층 대기에서의 날씨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고도 약 5km 높이에서의 압력차를 통해 빠른 속도의 바람이 있을 것으로 그는 추측하였고, 독일 기상학자들과 기후학자들은 이 바람을 연구하여 “제트 기류”(jet streams; Strahlstrom)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쾨펜의 시스템에서 개별 지역의 기후는 평균 기온이나 더 큰 기후대의 기후 특성으로 녹아들어갔습니다. 기후과학이 전지구화되면서 얻은 가장 큰 지식적인 소득은 대기 동역학의 인과관계를 더 큰 규모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지리적 개념에서 출발한 기후 개념은 이러한 역사적 과정과 기술적 발전을 거치면서 전지구적인 대기의 동역학과 연결되는 물리적인 개념으로 변해 갔습니다. 스웨덴의 기상학자 토르 베르게론(Tor Bergeron)은 “동적 기상학”(dynamic meteorology)이라는 이름을 따라 “동적 기후학”(dynamic climatology)을 만들어냈습니다.

기후를 물리적으로 이해하면서 인간적인 규모를 상실했다
고전 기후학은 본질적으로 지리적인 과학이었고, 실험적인 데이타와 지역적인 세부적 관측 항목들이 매우 중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학은 기상학적인 데이터와 세부적인 것들을 지향하고 전체론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특성들이 양적이고 물리적인 접근에 중대한 장벽으로 작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다양한 날씨 현상들이 단순한 수학적인 관계 도출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론가들은 반대편에서 이런 양적인 물리적 이해를 비판했으며, 이들은 주로 노르웨이 물리학자 빌헬름 비에르크네스(Vilhelm Bjerknes)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비에르크네스는 20세기 초반 무렵 대기의 프로세스를 양적으로 표현하는 7개의 편미분방정식을 구성하는 기초적인 이론적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정식은 모든 위치에 대해 7개의 기상학적인 변수의 시공간적인 동적 변화를 기술하며, 물리적인 법칙과 그 법칙으로 표현되는 미분방정식의 해에 기반해 날씨 예측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Bjerknes 1904; Gramelsberger 2009).
비에르크네스의 연구는 기상학과 기후학의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일보였습니다. 물론 그 이론의 혁명적인 위력이 완전히 발현되기까지는 반 세기가 더 필요했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대기 변수들과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과정들은 인간이라는 요소와 인간사를 배제해버렸습니다. 기상학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인간 본위의 전체론은 물리적인 환원주의와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추상적인 수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비에르크네스의 초기 방정식은 분석적으로 풀 수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실용성이 없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 과학자 루이스 프라이 리차드슨(Lewis Fry Richardson)은 소위 수치해석을 이용해 미분방정식을 풀어 날씨 예측을 시도했습니다(L. F. Richardson (1922/2007) <Weather prediction by numerical process>. reprint of 1st ed 1922.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 219).
비에르크네스는 자신의 방정식을 풀지 못했지만, 이러한 날씨 과학을 어업에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후 정부 재정으로 베르겐 기상학 스쿨(Bergen School of meteorology)을 만들었습니다. 이 학교는 대규모 날씨 시스템과 사이클론 발생을 설명하는 한대전선이론(polar front theory; 중위도 저기압 발생 이론)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대기의 물리학과 날씨 예측에 관심이 많은 기상학자들과 대기과학자들을 자극했습니다. 날씨 예측을 수치적으로 해낸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였습니다. 1950년, 수학자 존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과 기상학자 줄 그레고리 차니(Jule Gregory Charney)는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 중의 하나를 이용해 초기 편미분방정식을 단순화하여 처음으로 “수치로 날씨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이후 이들 팀에 있었던 노먼 필립스(Norman Phillips)도 1955년 날씨 예측 모의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날씨 모델, 소위 일반 순환 모델(General Circulation Models; GCM)은 대기 프로세스의 동역학을 이해하고 조사하는 일종의 가상 실험실입니다. 처음에 이 연구 분야는 소규모였고 몇 그룹들만이 기후 모델을 만들어 실험했지만, 1970년대 이후 빠르게 팽창해나갔습니다. 컴퓨터가 빠르게 성장하고 사헬(Sahel) 지역 가뭄으로 수십 만 명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고 환경운동이 일면서 기후 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찰스 D. 킬링(Charles D. Keeling)이 1960년대 초반에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확인했고(Weart 2008; Edwards 2010), 1970년대 초반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일면서 이산화탄소 문제가 과학자들 사이에 재해석되었고, 이것이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1981년 기후과학자 제임스 E. 한센(James E. Hansen)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최초의 장기모델을 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Hansen et al. 1981). 엄청난 불확실성이 포함된 단순한 모델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의 연구는 온난화 경향을 지적해냈으며, 장기적인 기후예측과 정책적인 도구로서 기후 모델을 활용할 수 있음이 그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지식과 컴퓨터 성능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시스템적인 개념을 컴퓨터 코드로 전환해갔습니다. 지구를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보는 가이아 관점을 반영하여, 프란시스 P. 브레서튼(Francis P. Bretherton)은 지구 시스템 과학(Earth System Science)(Bretherton, 1985)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대기 프로세스의 물리적 모델을 해양 모델, 얼음과 토양 모델, 화학적 생물학적 모델과 다양한 스케일에서 결합한 것이 지구 시스템 모델링인데, 이것이 이후 십여 년 동안 주도적인 패러다임이 되었고, IPCC 기후 예측 시뮬레이션의 표준 지구 시스템 모델이 되었습니다.
독일 기후학자 헤르만 플뢴(Hermann Flohn)은 지리학적인 고전 기후학과 물리학적인 동적 기후학의 지식적인 괴리가 커져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더 폭넓고 통합된 학문을 만들고자 했으며, 이것을 “현대 기후학”이라고 불렀습니다(Heymann 2009). 그의 시도는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각 분과의 변수들, 레퍼토리, 표준, 관심, 접근 방식, 연구 방식, 패러다임이 너무나 괴리되어 있어서 서로 알아보기도 어렵고 소통도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양적인 수치 모델을 이용해 점점 더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시뮬레이션 하고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렸습니다. 이에 비하면 전통적인 기후학은 지루하고 보수적인 역류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초기 냉전 시기 동안 기술과학적인 방향으로 지식 정치학이 바뀐 것도 기후학이 탈인간화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수치 모델은 복잡한 환경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기후과학에서 만들어진 전지구적 환원주의
기후 연구에서 지구화 경향이 물리적인 환원주의와 결합하면서, 환원주의가 전지구화되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과학적, 정치적, 문화적, 기술적인 조건이 받쳐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후는 전지구적으로 연결된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엄청나게 복잡한 현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동시에 기후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현상입니다. 고전 기후학에서 스케일 문제는 정치적인 동기와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식민지에서의 이해 관계, 나치 독일에서는 독재 정권의 유지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마틴 마호니(Mahony 2016, pp. 29–30)는 제국이 ‘전지구적인’ 과학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공간적인 확대가 전세계적인 새로운 관심과 이해관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후 과학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기술입니다. 컴퓨터와 컴퓨터 모델은 모두 전지구화 의제를 만들어냅니다. 위성과 위성관측 같은 기술은 전지구를 조망할 수 있게 하고, 빙하 코어 분석 기술로 80만 년 전 기후 변화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전지구화 환원주의를 길러낸 것입니다.
한편으로, 전지구화 환원주의는 비싼 비용을 치렀습니다. 소규모 지역적 관점을 무시하게 되었고, 인간을 전체 그림에서 제거했으며, 대안적이고 지역적이고 토착적인 기후 지식들의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1980년대 이후로 이렇게 제거된 소규모의 그리고 인간 규모의 인자들을 되살려보려는 시도가 있어왔습니다. 기후과학의 범위를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는 대부분 양적인 모델링 패러다임 하에서 이루어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 변화의 영향과 비용을 평가할 때입니다(e.g., Stern 2006).
그러나 자연 세계의 모델에 양적인 영향과 경제 모델을 집어넣으면 그 모델링의 접근 방식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방향성이 더 강화됩니다. 최근 들어 역사학, 인류학 등의 인문학자들이 전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좀 더 인문학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Holm et al. 2012; Palsson et al. 2012).
기후 연구가 전지구화된 역사를 보면 탈인간화된 기후과학을 되돌려놓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첫째, 위로부터의 지식과 아래로부터의 지식의 “중간”을 만들어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지구화된 과학은 강력한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배경이 있어서 이를 분석하고 분해하고 더 넓은 관점에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전지구화된 과학은 여전히 주류이며, 지식의 우위에 있으며 과학기술적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 모델링 사업, 대규모 기술 기반시설들, 강력한 기관에서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 보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힘이 없다면 변화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셋째로, “인간적인 규모”로 전환하고 새롭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도는 필요하고 시급합니다. 그러나 전지구적인 환원주의의 덫을 피하려면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문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열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인류세 개념도 규모가 매우 큰 개념이며, 또 하나의 전지구적인 환원주의의 수단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직은 인류세 개념이 인간과 지역을 기후와 환경 변화라는 그림 속에 다시 집어넣는 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번역, 요약 : 황승미 (녹색아카데미)
알림
댓글이나 의견은 녹색아카데미 페이스북 그룹,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철학 세미나 게시판과 공부모임 게시판에서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